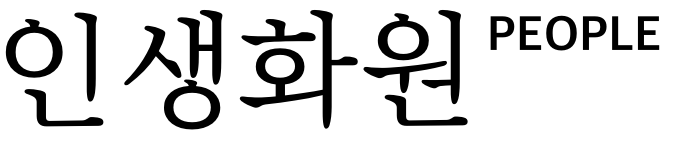자식들, 나의 기쁨과 미안함
아이는 작은 우주였다. 새벽마다 젖병이 별처럼 반짝이고, 열 오른 이마는 내 마음의 기압을 바꿔 놓았다. 이름표를 처음 달아 주던 날, 신발 끈을 매어 주던 손이 떨렸다. 운동장의 함성, 학부모 의자에 앉아 있던 내 등허리의 긴장, 집으로 돌아와 국을 데우며 혼잣말로 건네던 “잘했다” 한 마디—그 모든 순간이 나를 더 큰 어른으로 만들었다. 넉넉히 주지 못한 날이 많았다. 미술학원 대신 공책 한 권을 더 사 주고, 소풍날 과자 봉지를 고르며 마음속으로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표정을 고르게 했다. 성적표보다 마음을 먼저 보자고, 이기는 법보다 함께 가는 법을 배우자고, 말보다 식탁 위 반찬의 균형으로 가르치려 애썼다. 아이들이 자라자,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법을 배웠다. 뒤주처럼 조용히 마련해 둔 겉옷, 가방 속 몰래 넣어 둔 간식, 주머니 깊숙이 접어 넣은 용돈 한 장. 잔소리 대신 믿음을, 걱정 대신 기도를 건넸다. 때로는 아이들의 등 뒤에 서서 바람막이가 되었고, 때로는 먼발치에서 박수만 쳐 주었다. 미안함이 잔으로 남을 때가 있었다. 그 잔을 물로 채우지 않고, 하루의 노동과 짧은 감사로 채웠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의 삶 속에서 내가 미처 주지 못한 사랑이 다른 모양의 꽃으로 피어 있음을 보았다. 누군가를 도우려 먼저 손 내미는 습관,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는 인내,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성실—그건 다 우리 집 밥상에서 자란 씨앗들이었다.


남은 시간의 의미
아침 창턱에 앉은 햇살을 하루치로 삼는다. 물 끓는 소리, 찻잔에서 오르는 김, 달력의 빈칸에 작은 약속 하나.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천천히 움직일수록 더 또렷해진다. 나는 많이 가지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오래 남는 것을 고른다. 안부 한 통, 짧은 메모, 제철 과일 한 접시. 부탁은 미루지 않고, 고맙다는 말은 아끼지 않는다. 내게 남은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끝까지. 내려놓는 법을 배우니 손이 가벼워졌다. 오래 붙들었던 걱정들을 바람에 털어 보내고, 대신 오늘의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어제의 상처는 오래 눌러두지 않고, 내일의 두려움은 너무 앞당겨 오지 않는다. 지금의 빛을 한 줌 더 받아 쥐는 일—그것이면 충분하다.


늦었지만 나에게 보내는 인사
긴 숨을 다 쉬고 나니 남는 것은 소박한 것들이었다. 밥 냄새, 빨래의 햇빛,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 젊은 날 내 곁을 지나간 온갖 바람을 탓하지 않기로 했다. 바람은 가지를 흔들었지만, 뿌리를 더 깊게 내려 주었으니. 이제 나는 그동안 속으로만 부르던 이름을 드디어 소리 내어 부른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온 그 사람, 중요한 순간마다 뒤로 물러나 자리를 내어 준 그 사람, 상처를 숨기고도 하루의 일을 끝까지 해낸 그 사람. 그래서 나는 알겠다. 내가 고마워한 ‘너’는, 언제나 나였다는 것을. 오늘 나는 나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래도 고맙다. 잘 버텨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