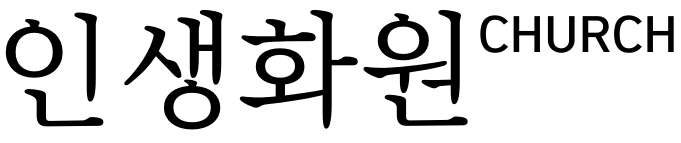울진 바닷가에서 태어나, 남매들과 함께한 유년 시절
업로드중입니다.나는 1940년 울진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바다가 지척에 보이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지요. 우리는 네 남매였고, 나는 셋째 딸이었어요. 막내는 아니었지만, 언니와 함께 살림을 돕고 동생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농사일과 집안일이 겹치면 아이들도 일손이 되어야 했지요. 그 시절은 다들 가난했어요. 고무신 한 켤레 아껴 신으려고 장독대 옆에 벗어두고 맨발로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우리에겐 익숙한 삶이었어요. 그렇다고 항상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자매들과 강냉이 볶아 먹고, 바닷가에서 조개 줍던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정겹고 따뜻해요. 학교는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몇 년만 다니다가 일을 거들어야 했지요. 그래도 그때 배운 글 덕분에 지금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몸에 밴 성실함과 책임감이 지금까지도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어요. 유년 시절,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길이 그렇게 천천히 열렸던 것 같아요.
열아홉, 얼굴도 모르고 시집간 그날
나는 열아홉 살에 시집을 갔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그땐 어른들이 정해준 대로 얼굴도 모르고 시집가는 게 당연했지요. 남편 얼굴을 처음 본 건, 결혼식 날이었어요. 낯선 집, 낯선 사람들 틈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속으로 "이게 내 인생인가…" 싶을 만큼 두려웠어요. 그 집에는 시어머니도 계셨고, 시댁 식구들도 함께 살았어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시동생도 있었지요. 어린 나이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그런 집안에 들어가 살려니 외롭고 힘들었어요.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고, 말실수라도 할까 봐 늘 조심스럽고 긴장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이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말 대신 기도처럼 가슴속에 담았어요. 그게 내가 살아낸 방식이었고, 그때부터 인내라는 걸 배워갔어요. 시댁살이의 시작은 고되었지만, 그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인생의 첫 번째 고비였고, 그때부터 내 삶은 조금씩 깊어졌어요. 지금의 믿음도, 그 시절의 눈물 위에 쌓인 것 같아요.